[아침뜨락] 김경구 아동문학가
얼마 전 집에 쪽마루가 생겼다. 쪽마루는 한두 조각의 통널을 가로대어 좁게 깐 마루를 뜻한다. 보통 방문 앞에 덧달아둔 형태로 처마 아래에 설치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골목길 첫 집이다. 골목길에는 우리 집을 포함해 세 집이 살고 있다. 그래서 골목길은 아주 짧고 조용한 편이다.
지금은 없지만 처음 이사 와서는 하얀 나무 울타리에 덩굴장미를 심었다. 이내 덩굴장미는 줄줄줄 가지를 뻗었다. 우리 식구들은 덩굴장미 아래에 돗자리를 깔고 커피도 마시고 개미도 구경하곤 했다. 마당이 없다 보니 골목에 빨래 건조대를 놓고 빨래를 널기도 했다. 골목이 마당이 된 셈이다.
그러던 어느 날 들마루를 얻어와 골목길에 놓았다. 가끔 세 집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차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잠이 안 오는 여름밤에는 들마루에 앉아 별을 보기도 했다. 우리 아이들은 들마루에 배를 깔고 숙제도 하면서 놀곤 했다. 하지만 비와 눈을 맞고 제대로 관리를 못해 서서히 망가졌다. 끝내 하나하나 떼어 내어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우리 집 울타리와 덩굴장미가 사라지고 그곳에 방이 만들어졌다. 골목길 쪽은 벽이나 작은 창을 내라고 했지만 우리는 베란다 문 같은 큰 유리문을 만들었다. 문겸 창문이 된 셈이다. 실제로 쓰는 방문은 반대쪽 안으로 나 있어 사용은 덜 했다. 그래도 환기를 하거나 비 오는 날에는 유리문을 열고 빗소리도 듣고 앵두나무도 봤다.
그러다 작년부터 이 큰 유리문을 열고 나오면 쪽마루가 있었으면 했다. 예전처럼 골목 들마루에 앉은 것 같은 느낌을 되살리고 싶었다. 쪽마루가 생긴다면 벤치 같은 느낌 될 것 같았다.
쪽마루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지 1년 반 정도 되었을까. 건축 일을 하는 지인이 쉬는 날 연락도 없이 오더니 뚝딱뚝딱 윙윙, 잠시 후 쪽마루가 생겼다. 처마 길이도 짧았는데 그 길이에 맞춰 쪽마루를 만들어 주었다. 썰렁하던 곳이 꽉 찼다. 아내는 얼른 커피를 가지고 나갔다. 골목 식당이 아닌 우리들만의 카페가 된 것이다. 그러자 예전 덩굴장미 아래 돗자리에서, 또 들마루에서 마시던 커피가 떠올랐다. 그때도 장미 카페나 골목 카페라고 하면서 웃던 것도 생각났다.
골목을 청소하거나 감을 따거나 앵두를 딸 때면 쪽마루가 쉼터가 될 것 같다. 책을 읽다가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쪽마루에 놓고 소일을 계속해도 될 것 같다. 며칠 전에는 오일스테인 참나무 색으로 색칠도 했다. 골목에 사는 신종이네 아빠가 새로 생긴 쪽마루를 보고 쓰다 남은 것을 준 것이다. 덕분에 쪽마루가 더 예뻐지고 반질반질 윤이 난다. 아내는 어디서 얻어 온 것인지 작은 레몬 화분을 쪽마루에 올려놓았다. 그 외 작은 화분 두 개를 조르르 줄맞춰 놓았다. 쪽마루랑 정말 잘 어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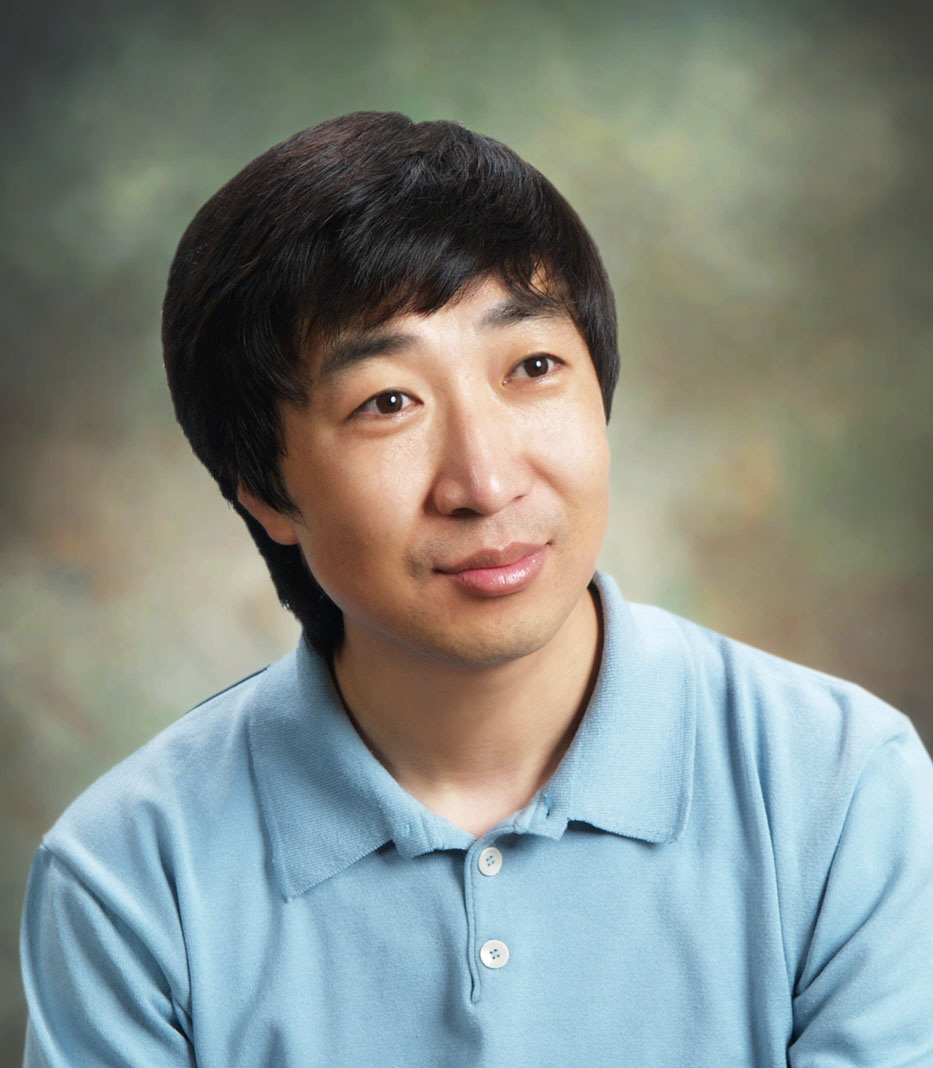
어쩜 쪽마루는 아침에 새들도 앉았다가 갈 것이다. 뽕나무에 오디가 달리면 동네 참새들이 몽땅 놀러 올 것이다. 배불리 먹고 쪽마루에서 앉아 밀린 수다를 떨지도 모른다. 햇살이 좋은 날에는 길고양이들이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갈지도 모른다. 우리 동네는 길고양이가 많은 편이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우리도 길고양이에게 밥도 주고 새끼를 낳으면 집도 만들어 주고 보살피기도 했다.
아주 더운 날 우리 집에 편지가 온다면 막 달려가 집배원 아저씨도 부를 것이다. 그리고 시원한 음료수를 드리며 "여기 쪽마루에서 잠깐 드시고 가세요."라고 얘기하고 싶다. '쪽마루야, 우리랑 오래오래 함께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