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뜨락] 김경구 아동문학가
요즘은 나무의 초록빛이 참 좋다. 덥지만 그래도 나무 그늘에 가면 시원하고 편안해진다.
나무 아래서의 바람은 선풍기 바람이랑 다르다. 그래서 더 깊고 크게 숨을 쉬게 된다. 마치 바람을 과자처럼 먹는 것 같다.
집 근처에 나무 색깔도 좋고 바람도 맛있을 것 같은 곳이 있다. 바로 호암지다. 요즘은 호암지에 갈 때마다 시 읽는 재미에 푹 빠졌다. '풀꽃들의 노래'라는 시화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플래카드에 한 편 한 편 담긴 시화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잡아당긴다. 다양한 시는 우리네 삶을 잘도 담았다. 평상시 운동 삼아 휙휙 호암지를 한 바퀴 돌지만 며칠 전엔 커피 한 잔 사 들고 마음먹고 천천히 시화를 감상했다.
적당한 햇살이 초록 나뭇잎 사이사이로 쏟아지고 가끔씩 새소리도 정겨웠다. 시 감상에 푹 빠졌을 때 달콤한 행복이 밀려왔다. 사는 게 뭐가 바쁜지 잠들기가 바빴던 것 같다. 좋아하는 커피와 새소리와 바람 소리, 계속 눈 맞춤하는 다양한 시화... 그 순간 찌릿, 전기에 감전되듯 행복에 감전되었다. 이대로 잠깐 세상이 멈춰도 좋을 것 같았다.
시화를 눈 맞춤 하기까지 많은 시인들은 어떤 시를 전시할까? 또는 자연과 어울리는 새로운 시를 창작하느라 늦은 밤까지 온 힘을 썼을 것이다. 거기다 그림은 어떤 것으로 고를까? 또는 그림 대신 사진은 어떤 것으로 넣을까? 등 많은 생각을 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야외 시화전이라 실내와는 달라 신경이 쓰였을 게 분명하다. 비 소식이 많던 때라 혹여 비를 맞고 전시한 건 아닐까 생각이 되었다. 끈으로 묶고 잡아당기고 시화 한 점 한 점 간격도 맞추며... 아마도 여럿이 함께 힘을 보탰을 것이다.
시화전을 다 볼 때쯤 생각 하나가 스쳤다. 예전 학창시절 시화전 때이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내 작품이 처음 전시되는 시화전이었다. 누군가 내 시를 읽는다는 것이 무척 설렜다. 학교가 아닌 시내 근사한 전시공간에 내 작품이 전시된다니 기대가 되었다.
패널을 구해 도화지를 대고 호츠케츠로 박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린 다음 투명비닐을 대고 다시 호츠케츠로 박았던 것 같다.
두 작품을 하고 하나는 나름 신경을 쓴다고 박에다 시화를 꾸몄다. 박은 울퉁불퉁해서 글씨쓰기가 힘들었다. 며칠 늦은 밤까지 시화 준비에 매달렸다.
패널시화는 비닐을 잡아당기며 호츠케츠로 박았는데 힘들었다. 비닐이다 보니 촘촘하게 펴 잡아당겼다고는 하나 그렇지 못했다. 다시 잡아당겨 박길 몇 차례 끝에 겨우 끝냈다.
그런데 시화전이 열리지 않았다.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다. 준비했던 기억과 완성된 작품만 생각난다.
그래도 내 작품에 취해 방안에 잘 걸어 두었던 것 같다. 이사 갈 때마다 갖고 다니다 어느 순간 사라졌다. 그림과 시 제목이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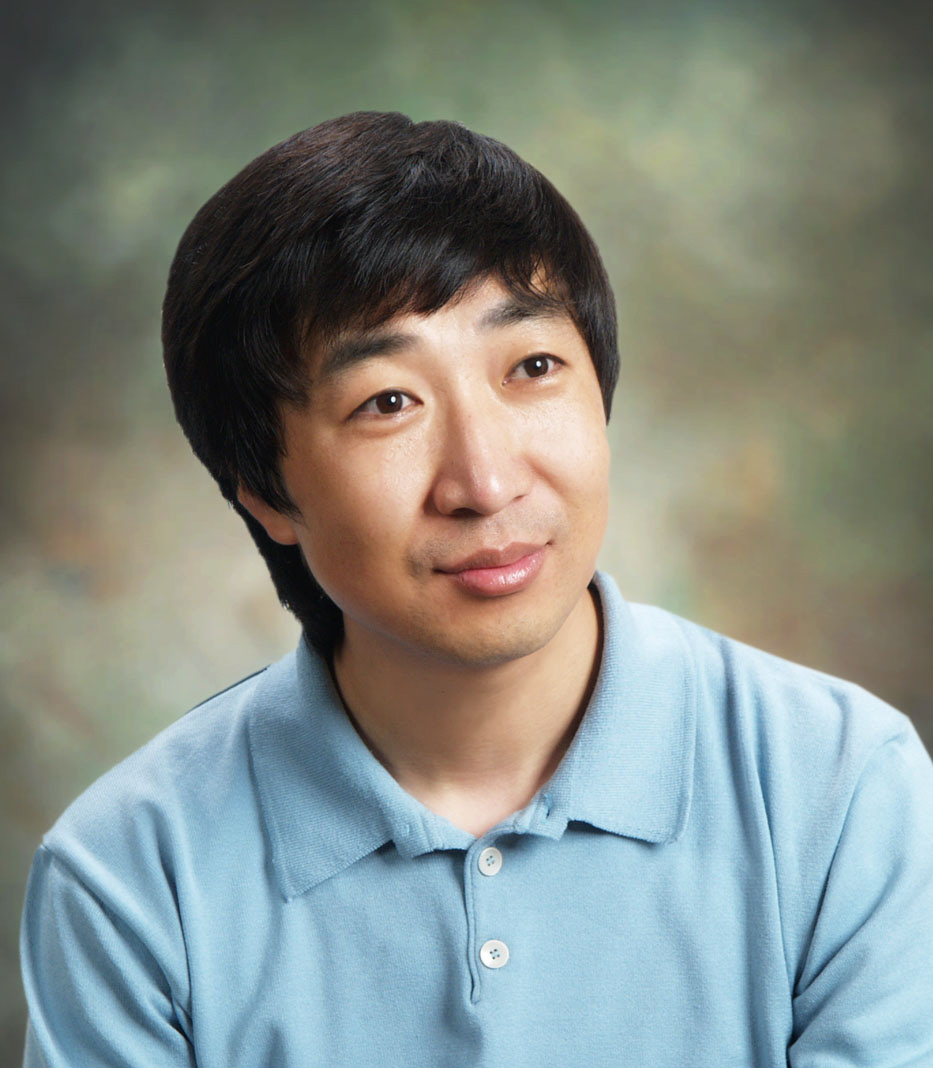
지금도 난 길을 걷다가 시화전이나 그림 전시회가 열리면 불쑥 들어가 감상에 젖곤 한다. 성격상 혼자 어딜 못 들어가는데 전시회는 용감하게 잘 들어간다. 어떨 때는 관람객이 나 혼자일 때도 있었다. 그럼 나는 작품을 존중하며 하나하나 진심으로 눈 맞춤한다. 그럴 때면 그 순간 근심 걱정도 잊고 행복하기만 하다.
지금도 호암지에선 '풀꽃들의 노래' 시화전이 펼쳐진다. 또 잘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전시회가 펼쳐질 것이다. 앞만 보고 무작정 달려야 잘 사는 것 같은 요즘이다. 잠시 전시회의 눈 맞춤으로 쉼표 같은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