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뜨락] 김경구 아동문학가
여름이면 여러 과일을 실컷 먹을 수 있어 좋다. 수박, 참외, 복숭아, 포도, 토마토 등 참 많다. 그중에서 복숭아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부드럽고 딱딱하면서 새콤달콤한 맛이 좋다. 지금도 복숭아꽃이 피면 가슴이 무척 설렌다. 복숭아꽃이 피면 찰칵, 휴대폰에 연신 사진을 담는다. 복숭아를 먹을 때면 어릴 적 생각이 항상 난다. 내가 살던 동네는 복숭아가 참 많았다. 우리 집 뒤쪽도 복숭아 과수원이었다. 그래서 소독을 할 때면 장독대 항아리 뚜껑을 덮으라고 미리 전하곤 했다.
학교 가는 지름길은 두 갈래 길로 아주 작은 비포장 길이었다. 그 길로 차가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리어카가 드나들 정도였다. 한 쪽으로 또는 양 옆으로 복숭아 과수원이었다. 손만 뻗으면 복숭아가 손에 닿았다. 복숭아 과수원이 끝나고부터는 집도 있고 도로와 연결되는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중학생 때는 늘 배가 고팠다. 학교에서 집으로 올 때면 짙은 노을이 하늘을 가득 차지했다. 등굣길은 종종 친구랑 갔지만 하굣길은 거의 혼자였다. 가끔은 작게 노래를 부르며 걸었다. 그런데 노을이 정말 예쁜 날이었다. 달력 속 사진보다 더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난 과수원 울타리 옆 풀밭에 털썩 주저앉았다. 노을이 더 짙어지고 내가 무슨 영화나 책속의 멋진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
그것도 잠시 그냥 슬펐다. 하마터면 찔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렇게 한참 노을을 바라보다가 다시 책가방을 들고 모자를 눌러 쓰고 집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학생, 배고프지? 여그 복쌍 좀 먹고 가잉?" 원두막에 앉은 할머니가 내려와 복숭아 두 개를 물에 싹싹 씻어 건네주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와작와작 복숭아를 먹으며 집으로 가는데 또 눈물이 났다. 아마도 심한 사춘기를 앓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다.
내가 살던 곳의 복숭아는 대부분 연둣빛으로 아주 크고 단단하고 잘 생겼다. 보통 복숭아처럼 달콤한 것도 물컹한 것도 있었지만 거의 딱딱하고 연둣빛 이었다. 자세히 생각은 안 나지만 외곽에 통조림 공장이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복숭아가 다 익기 전 따서 복숭아 통조림을 만든다고 했다. 지금도 복숭아 통조림을 보거나 여름이면 그 딱딱했던 복숭아가 많이 그립고 먹고 싶다.
한 15년 전인가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는 동창과 연락이 닿은 적이 있다. 그때 먹던 딱딱한 복숭아가 생각난다는 말에 잠깐 충주에 들러 복숭아를 주고 갔다. 그때 먹던 복숭아는 지금 없다며 그래도 한번 맛보라며 웃었다. 친구의 마음 덕분이었는지 그때로 돌아가 와작와작 열심히 깨물어 먹었다. 마지막 한 개를 먹을 때는 또 찔끔 눈물이 나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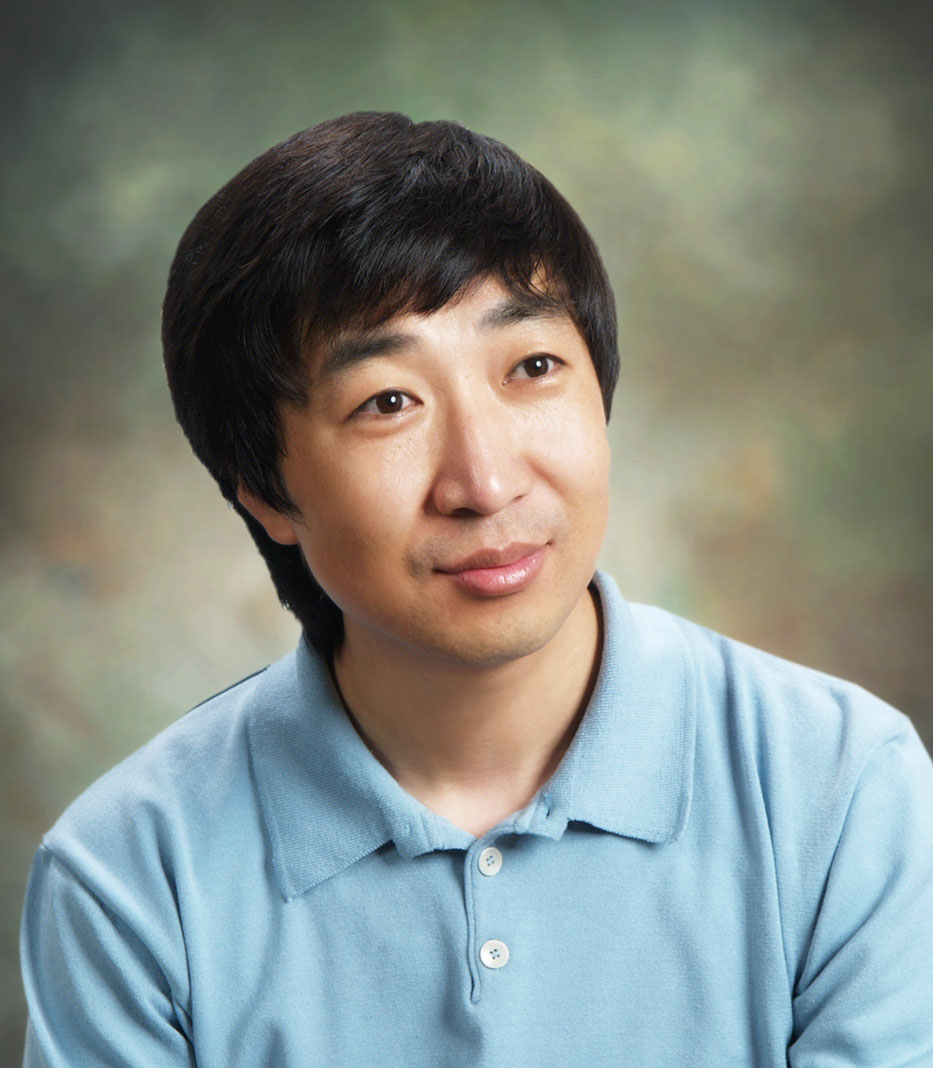
그래서 얼른 진짜 아픈 추억을 떠올렸다. 우리 동네 회초리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복숭아 나뭇가지였다. 종아리나 손바닥에 맞으면 얼마나 찰진지 몸을 척척 휘감고 따끔따끔 아팠다. 종아리에 맞은 만큼의 붉은 줄이 남기도 해 몇 대 맞았는지 금방 알 정도였다. 그래도 학교 오가는 길, 배가 고프면 뚝 따서 풀에 대고 쓱쓱 문질러 한 입 깨물어 와작와작 먹던 복숭아가 미치도록 떠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