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뜨락] 김경구 아동문학가
아파트에서 살다가 20년 전에 지금의 주택으로 이사했다. 작은 기와집이 있었으나 너무 낡아 다 철거하고 새롭게 집을 지었다.
여러 사정으로 아주 작은 집을 지었다. 그리고 둘째가 태어나면서 또 이래저래 공간이 필요해 집을 덧대어 만들었다. 어쩌다 보니 어느 순간 보일러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지 못했다.
그래서 집이 아주 춥다. 딱 방 한 개만 보일러 설치를 해 아버지를 모셨다.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둘째 방이 되었다.
참을만하고 살만하다. 하지만 화초들이 문제다. 집도 추우니 어느 해인가는 비닐로 덮어주었지만 몽땅 죽고 말았다. 애정을 주었던 화초들과의 이별 후유증은 며칠 갔다. 그러다 다시 봄이 오면 화분이 생기고 또 반복이 된다.
이번 겨울에는 화초들을 최대한 창가로 모았다. 그러던 얼마 전 문제가 생겼다.
화초가 아닌 '대파'를 키우게 된 것이다. 지인이 이것저것 챙겨 가져다주었다. 주변 지인과 나누어 먹었지만 파가 문제였다. 한꺼번에 먹을 수 없을 만큼 남았기 때문이다. 날씨까지 쌀쌀해 밖에 있다가는 꽁꽁 얼어 죽을 것만 같았다.
이를 어쩐담, 생각할 때였다. 눈앞에 화분크기의 스티로폼이 보였다. 그곳에 대파를 심으면 정말 딱 이었다. 파를 정성껏 심었다. 대파 화분이 탄생됐다. 멀리서 보면 정말 하얀 화분 같았다.
파는 잘라 먹어도 또 자란다. 당분간 파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파를 좋아한다. 라면을 끓일 때는 왕창 넣는다. 파가 들어가면 맛도 좋고 모양도 예쁘다.
어릴 적에는 파를 먹지 않았다. 파가 들어가면 건져 내고 먹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파를 넣은 라면을 먹게 되었고, 그 이후 나의 파사랑은 쭈욱 이어지고 있다.
이젠 파가 들어가지 않은 라면은 무엇인가 싱겁고, 느끼해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다. 또한 파김치도 정말 좋아한다. 그냥 보글보글 라면을 끓여서 파김치랑 먹어도 얼마나 맛있고 개운한지 모른다.
파김치는 삼겹살을 먹을 때도 찰떡궁합이다. 삼겹살보다 파를 더 많이 먹을 정도다. 파김치는 불판 위에 볶아 먹어도 색다르다. 어디 그뿐이랴. '파'하면 파전이 떠오른다. 어릴 적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파전을 지금은 없어서 못 먹을 정도다.
비 오는 날이면 지금도 가끔 떠오른다. 반죽한 밀가루에 길쭉길쭉하게 썬 파를 얹어 만든 파전. 지금이야 청양고추를 총총 썰어 넣기도 하고, 조갯살이나 굴, 오징어 등 해물을 넣어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예전 쭉쭉 손으로 찢어 얹은 파전은 고소했다.
무엇보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나는 정물화를 그릴 때 과일도 많이 그렸지만 파도 많이 그렸다. 꽃병 앞에 두 개의 파를 나란히 배치하여 그렸다.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파가 시든다.
그런데 이 시든 모습의 파도 참 매력적이다. 초록빛이 반쯤 꺾여 갈색 빛이 도는 파의 모습은 색다른 색감으로 다가온다. 파를 얼마나 많이 그렸는지 지금도 그 때의 구도나 스케치 했던 게 생각난다.
그 이후 잘 모르던 파꽃을 알게 되었다. 쭉 뻗은 파 끝에 동그란 파꽃. 자세히 보면 꼭 불꽃놀이가 떠오른다. 또 겨울 털모자 끝에 달랑달랑 매달린 방울 같기도 하다.
지금도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파꽃을 보고 말씀하신 게 잊혀 지지 않는다. 아마도 도시에서 살다가 오셨는지 선인장이 참 예쁘다고 했다. 어찌 보면 파꽃이 선인장처럼 보이기도 한다. 선생님이 결혼을 하고 요리를 시작하면서 파꽃을 아셨을 것이다. 그리곤 파꽃 터지듯 웃음을 터뜨리지 않았을까.
가끔 파밭을 볼 경우가 있다. 진초록으로 펼쳐진 파밭을 걸을 때면 가슴이 뻥 뚫린다. 파 대공 끝에 왕방울만한 파꽃이 피면 걷기 더 좋다.
요즘에는 감기 걸린 사람들을 종종 만난다.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때면 파를 추천한다. 나도 해본 적이 있다. 파 하얀 부분을 두세 토막 내어 손수건에 돌돌 말아 목에 두르고 자면 감기 증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창가에 놓인 스티로폼에서 잘 자라고 있는 대파를 보며 문정희 시인의 시 '파꽃길'을 다시 읽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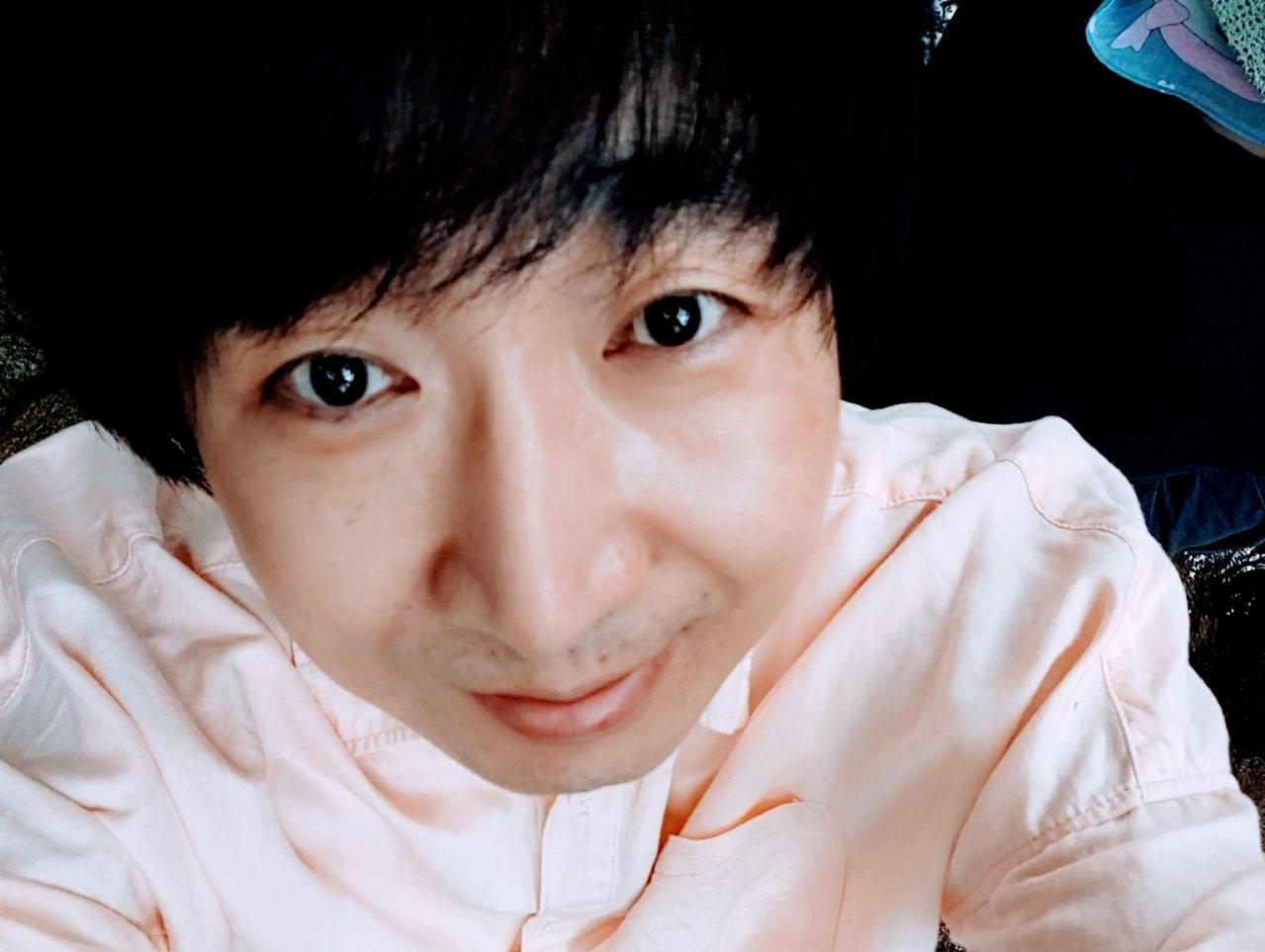
<흰 파꽃이 피는 여름이 되면/바닷가 명교리에 가보리라//조금만 스치어도/슬픔처럼 코끝을 건드리는/파꽃냄새를 따라가면/이 세상 끝에 닿는다는 명교리에 가서/내 이름 부르는 바다를 만나리라…….>

